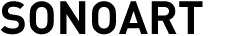이상선 _ 이명 展
2019. 2. 12 - 3. 9

이진성(소노아트)
작가는 ‘이명’이 있다고 했다. 꽤 오랜 동안 있어 왔다고 한다. 또 작가는 이것이 불편하지만 괜찮다고 한다.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이명’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누구나 이를 없애기 위해 어떤 수고로움도 아끼지 않고 노력해 볼 것이다. 그 불편함을 해결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니깐. 그런데 작가는 그런 ‘이명’을 ‘불편하지만 괜찮다’고 말한다. 귀가를 맴도는 고음 속에서 찾아오는 어지러움을 어느 정도 즐기는 듯한 이런 태도를 사실 이해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명’이 찾아오면 고음의 찢어 질 듯한 현악기의 소리가 귓가를 맴돌기 마련이다. 최소한 필자가 경험한 이명은 그러했다. 그 음은 곧 본인의 심장 펌프질과 동일한 템포로 귓가를 돌아 머릿속을 지배하게 된다. 이때 찾아오는 반복된 리듬은 점점 더 커져서는 고막을 울려댄다. ‘이명’에 대해 이러한 청각적인 구술에 덧붙여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다. 극중 주인공이 어지러움으로 인해 나선형의 계단을 제대로 오르지 못하고 이미 지나온 계단을 까마득하게 멀게만 느끼며 현기증을 느끼는 대목이 그것이다. 반복되는 나선형의 곡선과 계단의 중첩되는 직선이 드리운 이미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관람객들에게 현기증을 유발하게 만든다. 주인공의 고소공포증을 통해 그가 느끼는 불안감을 현기증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영화(히치콕(Joseph Hitchcock, 1899-1980)의 현기증(Vertigo, 1958))에서 시각적인 이명의 이미지가 연상된다.
이번 전시 제목은 위에서 설명한 《이명》이다. 청각과 시각적 증상으로 비유된 금번 전시에서 귓가를 울리는 찡한 ‘이명’은 무엇일까. 필자는 감각을 매료시키는 이번 전시의 현기증을 작가가 화면에서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보색의 대비들과 흐릿한 소재들의 형태감이라 유추한다. 우선 보라색과 노란색, 오렌지색과 올리브그린(풀색)색, 초록색과 붉은색, 붉은색과 푸른색의 대비 등 작품의 색감들은 이전 개인전(《무의_산(2018, 소노아트)》에서 와는 사뭇 달라진 면이 분명 드러난다. 물론 강한 색의 대비와 함께 작품의 소재들은 덜 분명하게 처리되어 있다. 금번 전시 작품들의 제목이 모두 동일한 <추상적인 인상abstract impression> 이기는 하지만 작품별로 이미지가 구체화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 않은가. 청각적인 자극은 극명하게 대비되는 보색의 색감으로, 시각적인 현기증은 불분명한 형태감으로 이해된다.
이전 개인전에서 작가는 본인이 무던히 비우고 있고, 의미 부여 자체를 거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의미 없음을 추구하기 위해 버리고 또 버리고 비우고 또 비우는 중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이번 전시에서 이상선은 최소한의 의미 없음을 추구하기 위해 의도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덧붙이지 않았다. 버리기 위해 의도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가벼워 지는 법을 익히지 않았나 추측하게 되는 대목이다. 마치 자유스러운 몸짓을 익힌 듯이 그렇게 말이다. 전통무용의 살풀이 가운데 흰 한복 자라이 얹힌 손끝의 파르르 떨리는 작은 떨림이 무대 위를 울리는 감동으로 전해 지듯이.
그동안 꽃잎들이 흩어져 이상선의 작품에서 더 이상 날지 않은지 십여 년이 지났다. 작가에게는 그 기간이 ‘이명’과도 같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단순하게 이번 전시의 제목이기에 의미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의미가 없어지기도 하고 부여되기도 하는 과정 중에 얻은 소외라 하겠다. 왜냐하면 금번 전시 역시 또한 그러한 과정에 일부이므로. 진행 중인 작가의 작품을 단정 지어 표현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본다. 지금 작가가 내딛든 발자국이 아니라 지나온 그 흔적들을 보고 유추해 본다.
가벼워진 발걸음과 발끝이 향하는 방향을.